며칠전 마르케스 부인 사망 기사를 보다가 ‘백년 동안의 고독’을 다시 읽어보려고 아주 오래전에 사놓고 방치해놨던 게 생각났다.
처음 읽은 게 대학교 저학년때쯤이었으니 20여년 만에 다시 폈는데,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잊고 있었다. 이 소설에는 끊임없이 같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읽는 내내 끝없는 호세와 아우렐리아노들을 구분하느라 허덕거렸다.

처음 읽을 때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읽다보면 도무지 도중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마치 색색의 셀로판 조각이 잔뜩 들어간 만화경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세월이 꽤 많이 흐른 지금에 읽어도 여전하다. 처음 읽을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에 급급했다면 이번에 읽을 때는 이 신기루 같은 도시 마콘도를 덮쳤다가 쓸려나가는 사회 정세의 변화가 좀더 눈에 들어오는 게 차이일까.
가장 마지막의
여기에 적인 글들은 영원히 어느 때에도 다시 되풀이될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은 100년 동안의 고독에 시달린 종족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처음에 읽을 때도 그랬듯이 부엔디아 집안의 어두운 100년의 시간을 정신없이 달리던 독자를 마치 최면에서 깨듯 한 순간 현실로 돌려놓는다.
화면 톤이 아주 어두운 한 편의 판타지 영화 같기도 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함이 펼쳐지는 우아한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한 여전히 신비로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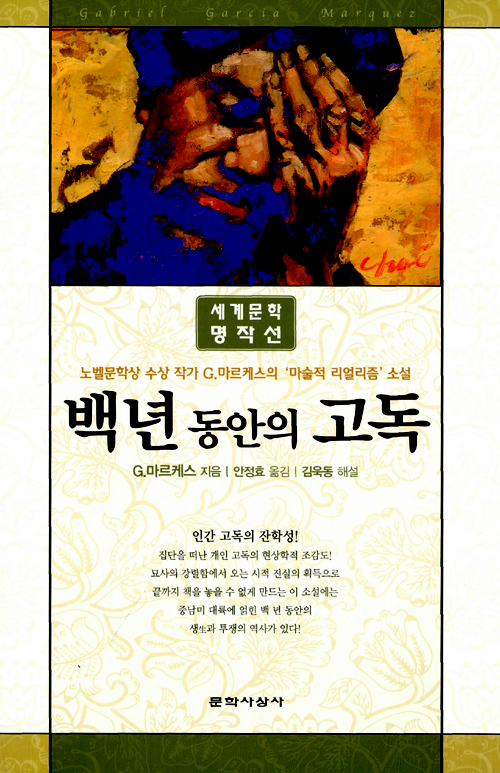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