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마지막에 부록으로 붙은 유홍준의 글에서 말을 빌자면 이 책 속의 박수근은 왼쪽보다는 오른쪽 사진이 그의 본연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이 다음에 커서 제가 시집을 갈 때에는 하루 세 끼를 조죽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사는 집으로 시집가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아버지의 끊임없는 첩질에 진저리 치며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하던 한 소녀는, 기적처럼 정말로 하루 세끼 걱정을 달고 살지만 그럼에도 오롯이 살뜰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났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전쟁의 한복판을 관통하며 흘러갔다.
난다님이 이야기한 책이었는데 검색해보니 주변 도서관에 딱 한 권 비치되어 있었고 이러면 왠지 더 궁금해서 상호대차로 빌렸는데 분량은 짧지도 길지도 않지만(연재 중에 김복순님이 뇌졸중으로 작고하여 미완으로 남았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 어느 장편 소설보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쟁의 한복판, 그 안에서 살아남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다.
작가가 담담한 필체로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들은 자신을 만나기 전까지의 남편의 가정사,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과정, 남편의 인품에 대한 경애(敬愛)가 넘치는 구절들도 좋았지만 국군이 들어오면 한시름 덜었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공산당이 마을을 다 뒤집는 혼란의 시기에 놀랄 만큼 영리하게 상황을 헤쳐나오는 작가의 기지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종교에 별로 긍정적인 편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힘든 상황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건 종교가 아니었을까, 수긍했을 정도. 진정한 종교의 힘이란 이런 게 아닐까.
작가의 작고로 원고가 미처 다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운 한 권이었다.
박수근이 1962년 국전 심사위원으로 갔다온 후 왜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이유가 궁금한데 이제는 알 길이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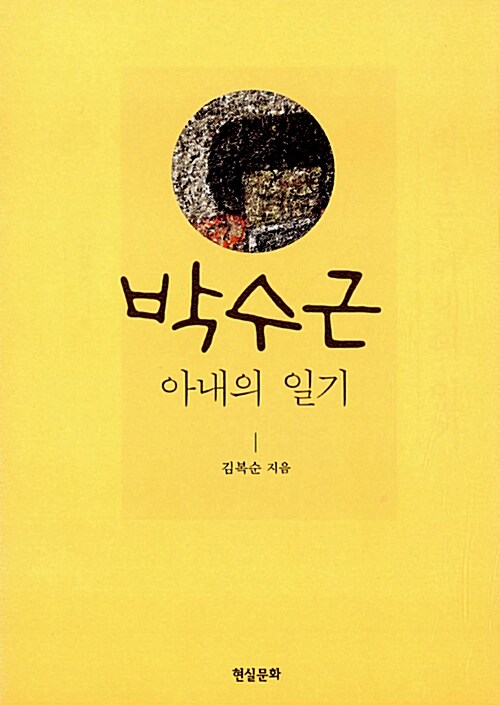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