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고 오랜만에 가볍게 읽을만한 철학책이라고 짐작하고 손에 잡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찬찬히 머릿속에 넣고 싶어서 일부러 하루에 한두챕터만 읽으면서 완독.
내가 대학에 들어간 해는 전공이 아닌 학부로 입학하는 첫 해였다.
선택지에는 국문/사학/철학/기독교학과가 있었고 1학년이 끝나면 전공을 정하는데 그 과에 정원이 넘치면 성적순으로 잘려나가는 것. 입시에서 벗어났다고 신나게 한 해동안 놀았으니 국문과를 가기에는 당연히 성적이 모자랐고 기독교학과는 종교가 없는 관계로 무리. 그때도 역사를 좋아해서 사학과로 가야할까, 생각했는데 보통 의견을 잘 내지 않으시는 아부지가 막판에 ‘그래도 사학과보다는 철학과가 취업이 잘될걸’이라고 하는 말에 ‘어이쿠, 그러고보니 내가 역사는 좋아해도 암기는 드럽게 못했지’ 하며 철학과를 덜컥 골랐다.(지금 와서 생각하면 둘 중 취업에 어느 쪽이 낫냐, 라는 건 아이고, 부질없어라. 
어쨌거나 처음부터 전공을 정해서 들어왔다면, 혹은 마지막에 아부지 말이 없었다면 인연이 없었을 철학이라는 학문은 막상 배워(?)보니 꽤 마음에 들었다. 학부에서야 좁고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겉핥기에 가깝게 훑기 마련인데 그래서 오히려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않으면 일부러 해볼 일 없을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그러고보니 나는 나름 학부제의 수혜를 입은 경우였을지도?)
철학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야 ‘점 볼 줄 아시냐’는 질문을 가장 자주 받거나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나는 지금도 철학자의 사상을 어렵게 많이 알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꾸준히 철학’하는’ 생활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라테스에서 꾸준히 ‘척추를 바로 세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꾸준히 생각의 척추를 의식적으로라도 한번씩 바로세워야 지금처럼 복잡하고 난장판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
SNS에 흐르는 수많은 이야기들, 내키는대로 고른 책을 그저 무의식적으로 읽어내리는 나날이 길어지면 머릿속은 어느 순간 대충대충 꽂아둬서 제멋대로 쌓이고 울퉁불퉁하게 책등이 튀어나온 엉망진창 책장처럼 되어버린다. 사는 데에 별 불편은 없지만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 내 의견이라는 게 있긴 한지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오랜만에 내 머릿속의 책장을 한번 털어내고 다시 고르게 꽂은 기분이었다.
오래된 철학은 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몇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사실 그리 크게 바뀌지 않았고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라면 작가가 매번 어딘가 카페에 자리잡고 책을 읽듯이 나도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간간히 마음에 드는 문장에 밑줄도 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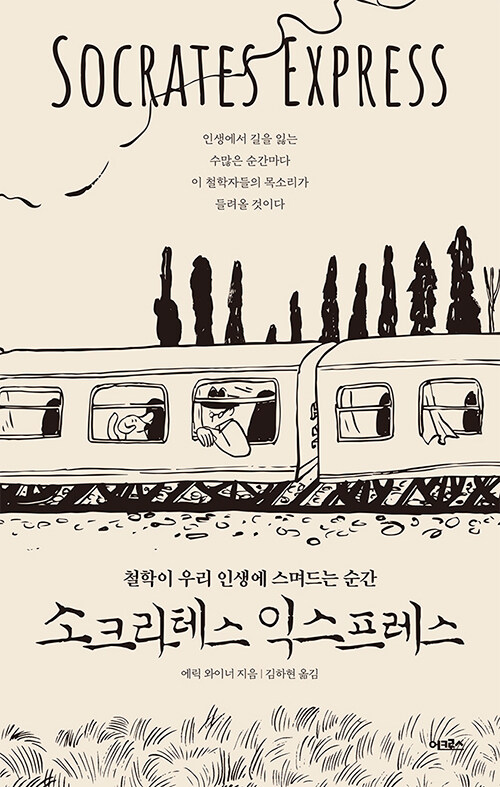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