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서가를 돌아다니다가 표지의 박물관에 표지만 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우리의 흔적이라는 문구에 혹해서 충동적으로 빌려온 책. 어떤 의미로는 표지로만 접하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만….

이 책은 일단 제일 첫 챕터인 ‘첫 인상’부터 당황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 동방 전체에 만연한 소름 끼치는 관습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처음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는 것인데, 바로 온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예를 갖추어 시신을 매장하고 고인의 부활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한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시신을 자리에 둘둘 말아 그대로 익어 썩어가도록 햇볕 아래에다 방치한다.
시체 냄새가 뒤덮고 있는 이곳에 오면 누구든 곧 보통의 시체 썩는 냄새와 천연두나 콜레라로 죽은 시체에서 나는 독한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자니, 바다가 내려다보이던 부산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조선 친구와 눈부신 오후를 즐기던 때가 생각난다. 그 때 갑자기 대나무 기둥 네 개 위에 널브러져 심하게 썩어가는 한 어린아이의 시체와 맞닥뜨렸는데, 공자님이 죽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풍기는 이 지독한 냄새와 끔찍한 모습에 비하면 우리네의 지옥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p22
길에? 시체가? 도무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찾아보니 ‘초분’이라고 해서 시신을 풀로 덮어 무덤을 만든 후 1~3년 동안 두었다가 뼈만 다시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고.(네이버 민족 대백과에서) 길에 저렇게 시신 위에 풀을 덮은 가무덤들이 널려 있었으면 그 냄새는 가히 압도적이었을 거다.
두번째 챕터 ‘상놈’은 내가 보기에 이 책의 백미로, 외국인 눈에 비친 참으로 적나라하고 한편으로는 유쾌한(?) 기록이었다.

길거리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바로 싸움이었다. 시중드는 몸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흙이 몸에 닿지도 않는 양반이 싸우는 경우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언제나 상놈이었다. 처음엔 말싸움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단계를 높여가는데, 각 단계는 얼마나 언성을 높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말을 빨리 뱉어내고 있는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펼쳐지는 광기의 최고 단계. 천지신명과 구경꾼들에게 하는 자신을 편들어 달라는 호소와 상대에게 퍼부어대는 쌍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외국인 누구라도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한 사람이 속에 품을 수 있는 화가 저렇게까지 클 수 있다는 사실에 겁에 질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사태는 끝이 나고, 싸움 당사자들은 어느새 각각 골목 한쪽 끝에 쭈그려 앉아 마치 온 사방 사람들이 자기 형제인 양 평화롭게 담배를 빨아대는 것이다
p72
그야말로 쇼미더머니….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자신들의 풍습을 따르려는 상놈의 곧은 마음을 깨뜨릴 수는 없다. 이들은 돈이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꼭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만족스러우면 하겠다고 할 것이고, 어떤 때는 돈을 좀 더 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주면 또, 당신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이들은 절대로 순수하게 돈에 의해서만 종속되는 관계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다
p86
의외로 역사가 깊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들 상놈의 종교는 조상을 모시는 것과 관청의 벼슬아치들을 증오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p86
이들이 삽을 쓰는 것도 놀랍다. 조선에 대해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가까이서 이들을 관찰한 동료 G. Heber Jones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신기한 발명은 조선에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기구 중에서도 가히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셋에서 다섯 명의 일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데, 땅을 잘 팔 수 있도록 쇠로 만든 보습에 나무로 된 긴 자루로 되어 있어요. 자루는 약 150센티미터이고 일꾼 중 우두머리가 조작해요. 삽 아랫부분에는 양쪽으로 하나씩 새끼줄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힘을 아끼고 싶어하는 일꾼들이 조작합니다.
p83
작업 중에 대장은 가끔씩 보습을 땅속으로 한 8센티미터 정도 밀어넣고는, 둘 혹은 네 명의 장정이 우렁찬 기합과 함께 흙을 2미터 정도 밖으로 날려 보내요. 딱 한 숟가락 정도 떠서 말이죠.”
한 사람이 일할 분량을 다섯 명이 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딱 한 번, 상놈의 눈에서 생기가 도는 것을 보았던 게 생각난다. 마치 그 옛날 용맹했던 시절 위험을 무릅쓰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p70~p72 석전(돌싸움)에 대한 설명
그것은 돌싸움에서였다. 그 고장에서 내로라하는 수백 명의 명사들이 편을 가른 다음, 한두근쯤 되는 돌멩이로 무장한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공중에 돌멩이가 미사일처럼 수없이 날아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자재로 돌을 던지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투석기가 자동으로 발사하는 것 같았다. 위험 속에서 모두들 눈이 살아 있었고, 돌격하거나 기어서 도망 가는 모양이 마치 야생 짐승이 떼지어 달려가는 것 같았다.
(중략)
그리고 찾아온 갑작스런 중단. 마치 골이라도 넣은 듯 터지는 함성. 상대 편의 최고 사수가 정확히 강타당했고, 즉사했다. 곧 그의 시신이 싸움터에서 치워진다. 그리고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저녁이 오기 전에 다른 편에 서도 한 사람이 쓰러졌다. 그렇게 결과는 동점이었다.
이것이 상놈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양같이 순하다는 그 어떤 족속 보다도 점잖았다. 오랜 전통인 돌싸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그들은 단연 평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다. 비록 개인적으로 싸움이라도 붙을라치면 광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긴 했지만 말이다.
며칠전에 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의 시작이 산업혁명 즈음에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축구팀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아스날은 무기공장 노동자가 만든 거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공 하나에 수십명이 쫓아다니는 짓 따위 하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돌로 상대방 머리를 겨누며 즐거움을 얻었다.(….)
조선에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데, 이왕이면 빨리 인내심을 기르는 편이 확실히 자신에게 좋다. 조선에서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재촉하고 닥달해봤자 아무런 변화 없이 느린 그대로일 것이며, 그들이 당신을 덜 사랑하게 할 뿐이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까지 느려 터진 나라가 빨리 하라는 의미의 말은 엄청 많다는 것이다.
p101
의외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할 일을 다섯명이 나눠 하며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분들이셨단다.(…)
작가는 부산에서 서울, 평양을 거쳐 만주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산으로 돌아왔는데, 재미있었던 건 처음에는 한국에서 먹는 식사에 대해 좀 불만이 많더니 중국을 넘어가고 난 후에는 그쪽의 기름진 요리에 두손을 들고 도중에 들어간 조선인 집의 김치와 밥을 반기더라.(그래도 역시 밥이 최고지)
어디선가 듣길,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 실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꼼꼼한 기록이지만 그것은 지배층의 기록일 뿐, 반대로 일반 평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남은 기록이 없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낀 것도 그 점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어느 왕이 무슨 업적이 있고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배웠지만 그 시절에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평민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이 외국인의 이야기가 그저 생소했다.
작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매력에 그렇게 끌렸던 건지, 9년동안 12번을 방문했고 각각 다른 계절에 다른 루트로 거의 전국을 다 누볐다고 하니 이곳에서 태어난 나보다 훨씬 많은 곳을 보고 경험했을 터.
그런 외국인의 시선으로 쓴 여행기라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보다 상황에 대한 앞뒤 설명도 충실하고 사진 자료도 풍성하며 번역도 중간중간에 작가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문구들은 역주로 추가해두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해서 즐겁게 읽었다.
어느 외국인의 단 10년의 기록에도 민간 설화, 설날 풍습 등에서 이렇게 새롭고 놀라운 게 많은데, 남아있는 않은 이야기 중에는 또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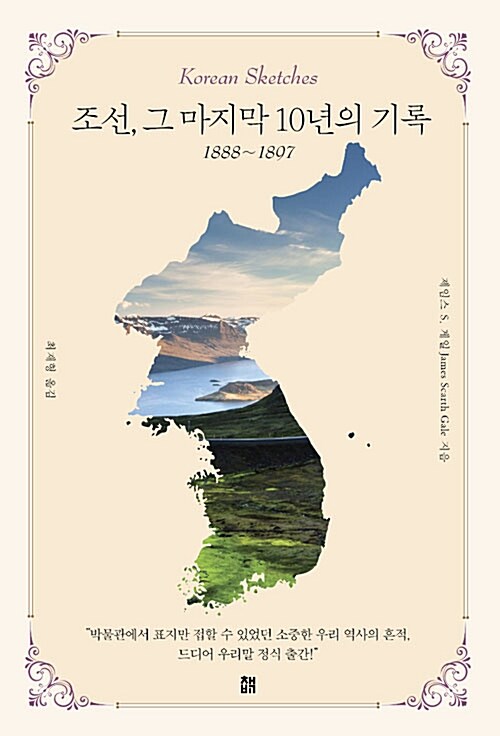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