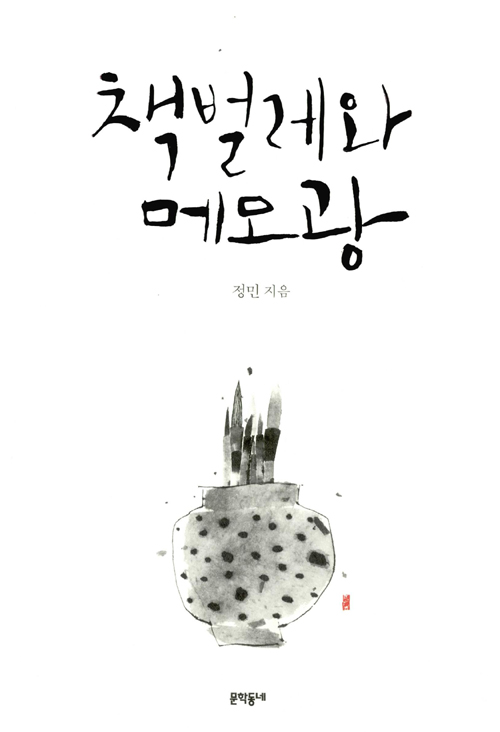십여년 전에 재미있게 읽은 뒤로 신간이 나오면 한번씩 눈이 가는 작가의 모르는 책이 도서관에 있길래 두께도 두껍지 않아 지난 혜린이 여름방학 때 도서관에서 같이 앉아 가벼운 마음으로 빌려 후르륵 읽어 넘겼었다.
에세이 느낌의 잔잔한 글이라 ‘미쳐야 미친다’에 비하면 아쉬웠지만 고서적과 책을 좋아했던 사람들에 대한 알쓸신잡(?)스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재미있을 만한 한 권이었다. 여름에 다 읽고 다시 빌려온 이유는 책 초반에 나오는 ‘장서인’에 대한 한중일 비교가 가끔 한번씩 생각나는데 이왕이면 자세히 저장해두고 싶어서.
장서인은 네이버 검색을 빌자면
책·그림·글씨 등의 소장자가 자기의 소유를 밝히기 위하여 찍는 인장.
[네이버 지식백과] 장서인 藏書印
유럽에서는 장서표가 성행한 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장서인이 발달하였다. 장서인을 찍는 목적은 소장자가 자기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때로는 자기과시나 교훈적인 목적으로 찍기도 한다. 인장의 재료로는 옥(玉)·돌·동·금·은 등의 금속, 상아·대나무·나무 등을 사용한다.
그 형태·인문(印文)·서체(書體) 등도 다양하며, 소유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어 흥미롭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장서인이 서적의 내력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작가 말마따나 굳이 민족성 운운할 일은 아니지만 한중일 세 나라의 장서인을 쓰는 방법을 비교해보면 어찌나 각 나라마다 ‘딱 그럴 법하다’ 싶은지 가끔 한번씩 생각이 났더랬다.

일본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새 주인이 전 소유주의 장서인 위에 ‘소(消)’라고 쓴 후 옆에 새로 자신의 장서인을 찍는다고 한다. 앞 주인의 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지금부터는 자신의 장서인이 유효하다는 심플한 표현. 문제는 이렇게 계속 ‘消’자를 찍어나가면 주인이 많이 바뀐 책은 마치 세금명세서 같이 보일 것 같다.

중국은 주인이 바뀌어도 앞 사람의 장서인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장서인이 많을수록 값도 올라가고 그 장서인 중에 유명인 것이 하나라도 끼어있으면 가격이 훌쩍 뛴다고.

한국은 주인이 바뀌면 전 주인의 장서인을 예리한 칼로 도려낸 후 그 안쪽에 약간 큰 종이를 덧대 붙인 후 잘려나간 글씨는 채워넣는다. 이 칼로 도려내는 작업을 하는 건 책을 사는 사람이 아닌 파는 사람이 하는 것.
글이나 읽는다는 양반이 책을 못 지키고 남에게 팔아먹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체면치레란다. 이걸 읽으면서 어찌나 ‘답다’ 싶던지. -_-
요즘처럼 어디에나 글들이 산만하게 넘쳐나는 시절이 아닌, 정말로 ‘글’이 희소하고 귀해서 한줄한줄에 집착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
중고등학교 때는 가끔 좋아하는 책에 내 도장 같은 걸 찍긴 했지만 나는 책을 판다고 체면이 상할 양반도 아니고 집의 책장은 항상 포화상태, 더이상 저 시절만큼의 사치품도 아니라 곱게 읽고 아니다 싶은 건 칼같이 중고로 넘겨야해서 더 이상 도장을 찍지 않지만 그럼에도 옛날 사람들의 장서인 문구들을 읽다보면 운치가 있어서 나도 뭔가 하나 만들어서 정말 아끼는 책에는 찍어둘까 혹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