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책은 난다님이 추천했던 <인생, 예술>.
찾아보니 작년의 첫 책도 미술 관련이었더라. 올 한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머리속은 어수선하고 마음은 괜히 뒤숭숭한데 쉽게 손에 잡기에는 미술 관련 책이 만만하다보니.
<박수근 아내의 일기>와 비슷하게 빌렸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저런 새로 보고 싶은 책들이 생겨서 잊은 동안 반납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도서관에서 보낸 알림 문자를 보고서야 깨달았다.
잠시 훑으니 책장이 제법 잘 넘어가서 하루 안에 다 읽고 내일 반납하면 되겠다(어차피 내일 ‘또’ 받아와야 할 책이 있다) 생각했는데 읽다보니 아무래도 쫓기는 기분이라, 다행히 내 뒤로 예약자가 없어서 반납일 연장.
보통 읽는 미술 관련 책들은 명화나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이 책은 드물게도 ‘현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
국내, 해외, 남성, 여성 골고루 배치된 구성도 좋았고 수백년 전 명화 속의 의미들을 새롭게 아는 것도 즐겁지만 나와 가까운 시간을 살아간, 혹은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들이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때때로 공감하고 감동했다.
일주일을 벌었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만 잡은 김에 읽다보니 결국 하루만에 끝났다. 언제나 ‘어렵고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현대미술 작가와 작품들에 대해 풀어내는 작가의 글솜씨는 쉽지는 않지만 차분하고 상냥해서 잠시나마 현대미술과 가까워진 기분마저 들 정도.
다만 현대 작가들이다보니 아무래도 도판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인지(이런 쪽으로는 비용 지불이 크지 않을까 싶음🤔) 작가 한 명 읽을 때마다 구글에 이름을 넣고 뜨는 이미지들을 노트북 창에 띄워놓은 채로 읽어야 했다는 점은 좀 불편했지만 평소라면 고르지 않았을 법한 책이라 왠지 모험하는 기분도 드는 새로운 해의 독서의 시작이었다.
그가 없는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순간, 그 상실감을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이 순간은 삶이 단순히 죽음을 유예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님을 알려 주었다. 무언가를 직접 겪어 내는 것만큼 살아 있는 우주를 기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고, 그래서 더없이 잔인하다. 불과 며칠 동안 경험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리고 결국 그가 떠나 버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녀석이 손수 이끈 이 상황에 온전히 머무는 것뿐이다.
p.146 <이 계절, 이 하루, 이 시간, 이렇게 흐드러진 벚꽃 그리고 우리-우고 론디노네>
하지만 만약 그가 묵묵한 노동자처럼 그림 을 그리지 않았더라면, 그저 예술가로서만 살고자 했더라면 그의 그림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곡진할 수 있었을까.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 ‘재능 있다’는 것은 ‘끝까지 순수하게 성실하다’는 것과 동의어임을, 나는 유영국이 온 생을 바쳐 증명한 그림을 보며 다시금 깨닫는다.
p.224 <끝까지 순수하다는 것-유영국>
“무릎 꿇은 여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녀가 일어섰을 때 얼마나 대단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p.261 <너는 네가 가진 전부다-가다 아메르>
가다 아메르의 자수회화 <귀걸이 한 짝을 한 여자 Porralit with One Earring>(2016)에서 여자의 얼굴은 미에 한슨의 <고통이 자라나는 곳 Where Pain Thrives>(2015)이라는 시의 한 구절로 가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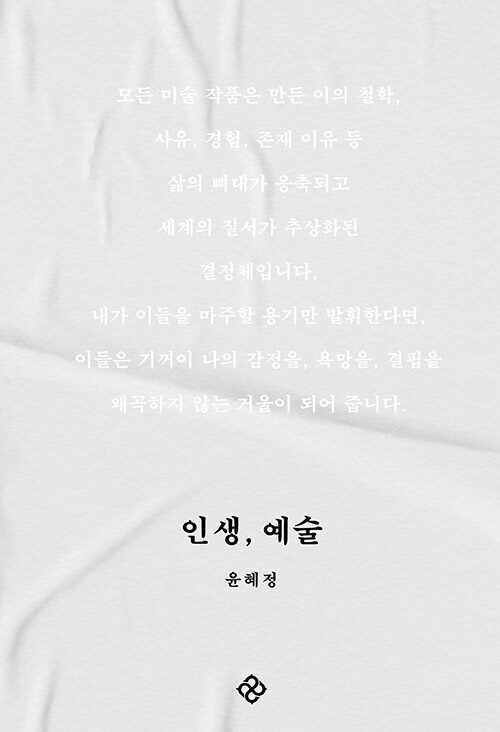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