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왕자와 공주들에게는 동화책에서와 같은 ‘그리하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엔딩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더라, 라는 주제로, 비슷한 주제의 다른 책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독일이나 러시아 왕실의 어두운 이야기, 혹은 그림 제목 덕분에 이름만은 전세계 어느 공주 부럽지 않게 널리 알려졌지만 보통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벨라스케스 그림 속의 마르가리타 공주 이야기를, 작가는 마치 어제 재미있게 본 드라마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하듯 신나게 술술 풀어놓습니다.(읽다보면 작가가 진심으로 즐기면서 쓰고 있는 게 느껴져요; )


이 마르가리타 공주는 남자 형제가 없어 그대로 스페인의 여왕이 될 뻔하다가 간발의 차로 태어난 남동생 덕(?)에 외삼촌에게 시집을 간 후 스페인 왕실과는 많이 다른 좀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의 시댁에서 그럭저럭 금슬좋게 살다가 아쉽게도 22살의 나이에 네번째 출산을 하던 중 죽었다고 해요.
이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매번 결혼관계도를 보며 멘탈이 붕괴되는 게, 저 마르가리타의 엄마는 외삼촌에게 시집을 온 것이었고 마르가리타도 다시 엄마의 남동생이자 자신의 외삼촌에게 시집을 갑니다. -_-; 자기네 푸른 피(…)를 유지하겠다고 차곡차곡 쌓아가던 근친결혼은 나중에는 수치로 따지면 부모나 형제보다 가까울 지경까지 높아지고 그 부작용으로 어느 초상화를 봐도 예전에 봤던 그 그림 같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죠.
저 길어진 하관(?)이 그 증거 중 하나로 나중에 심한 경우는 제대로 닫히지도 않아 침이 줄줄 샜다고 하니 뭐… -_-;
유럽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보통 잘 등장하지 않는 러시아 왕실의 원초적인 분위기(러시아 속담에는 ‘마누라를 두들겨팰수록 수프맛이 좋아지는 법’이라고 한다고라? -_-)나 분노조절장애로 닥치는대로 끝에 강철이 붙은 지팡이를 휘둘러대다 손주와 아들까지 죽인 이반 뇌제의 왕실에 차례차례 독살당하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일곱 왕후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보다 스펙터클했습니다(무슨 왕실이 법도 자비도 도덕도 없냐).
메리 여왕이 교수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상황을 가능한 한 극적으로 연출해보고자 했던 여왕은 호화스러운 검은색 옷 아래에 피처럼 붉은 속옷을 받쳐입고 붉은 장갑까지 맞춰 낀 채 단두대 앞에 목을 늘이기 위해 옷을 벗어 내렸지만 정작 그 붉은 색 때문에 정신이 산란해진 형리는 목을 세번이나 내리쳐야 했으며 마지막 절차로 죽은 자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높게 치켜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순간에는 평소하듯 머리칼을 움켜쥐고 들어올렸으나 여왕의 가발(…)이 쏙 벗겨져 머리가 공처럼 굴러가버렸다…는 에피소드는 참으로 현실적이죠. ( ”)
지난번 ‘무서운 그림으로 인간을 읽다’에 이어 단숨에 스르륵 읽은 한 권이었습니다.
작가의 문장도 좀더 유려해지고 이야기 사이 사이를 짚는 센스도 좀더 좋아진 듯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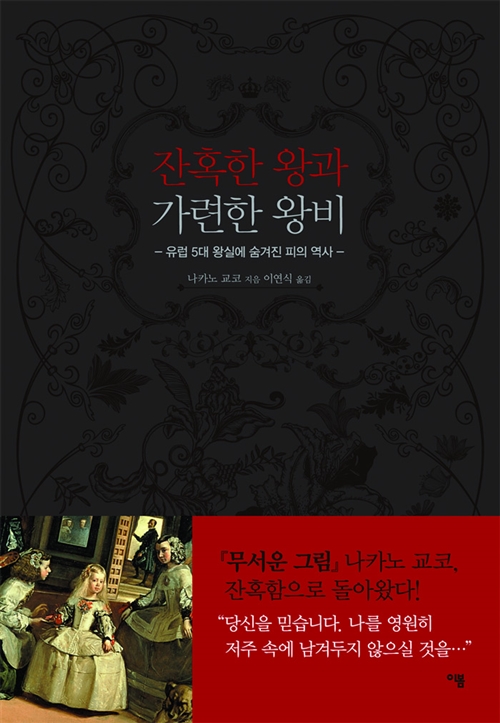
2 responses
@tw_Ritz 여름에 어울리는 호러(?)책을 읽은듯한 ㅎㅎ
@eiri34 독살과 교수형이 난무하니 그야말로 어지간한 공포소설보다 살벌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