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일로 린양도 보고 싶다길래 일찌감치 얼리버드 티켓을 끊어놨는데 관람객이 많다고 해서 타이밍을 도무지 못 잡다가 아예 하루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날을 잡았다.(그리고 그 뒤로 학교에서는 외부 활동 일정이 바뀌어서 내일모레 린양은 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야 함…
오랜만에 세 식구 아침부터 나들이.
공예품부터 갑옷, 그림과 태피스트리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시품들로 볼륨이 커서 찬찬히 보고 나오니 거의 한 시간 넘게 지나 있었다.
플래쉬를 쓰지만 않으면 사진 촬영도 가능.

갑옷 전시 옆에는 갑옷을 입었을 때 몸의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고 있다든지, 신경 쓴 티가 많이 나는 전시였다.



빠질 수 없는 건 초상화들.




시시의 그림은 보통

이게 유명하다보니 위의 그림은 설명을 보고 시시인 줄 알았다.

이번 전시의 메인은 역시 이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 실물로 보니 어린 공주의 얼굴이 섬세하고 똘망해서 화가가 이 공주에게 조카와도 같은 애정을 가지고 그렸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역사 속에서 여왕이 되거나 기록될만한 스캔들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공주의 이름이 남는 경우가 드문데 벨라스케스의 그림들 덕에 아마 가장 유명한 공주가 아닐지.
그녀는 후에 외삼촌이자 고종사촌(-_-)인 레오폴트 1세와 결혼했는데 예술과 문화를 사랑했던 부부로 금슬도 꽤 좋았으나 6년간 6번 임신을 하고(그중 2남 2녀를 낳았다) 7번째 임신에서 아이를 사산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22세 나이로 사망했다고 한다.
전시 마지막쯤에는 갑자기

우리나라 복식이 등장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2년, 오스트리아와 조선은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구의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오랜 경쟁관계에 있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자국 상인들이 조선의 개항장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오스트리아와 조선은 수교를 맺었습니다. 수교 선물로 고종이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보낸 조선의 갑옷과 투구는1894년 합스부르크의 수집품으로 등록됐고, 13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집에 와서 점심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보니 오늘 본 왕들은 전부 설명에 ‘정치는 좀 그랬지만 예술을 사랑했다’라고 붙어있는 게 웃겼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생각해보니 돈들여 수집하느라 정치는 뒷전이었을텐데(물론 둘 다 잘 한 왕들도 있지만) 이런 전시회에서는 그런 왕들만 이름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이러니.

평일 오전에는 그렇게 붐비지 않아서 적당히 잘 보고 나왔는데, 볼만한 게 많아서 방학 때 되면 다시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 싶다.
부지런 떨며 얼리버드 티켓 끊어놨던 보람이 있었던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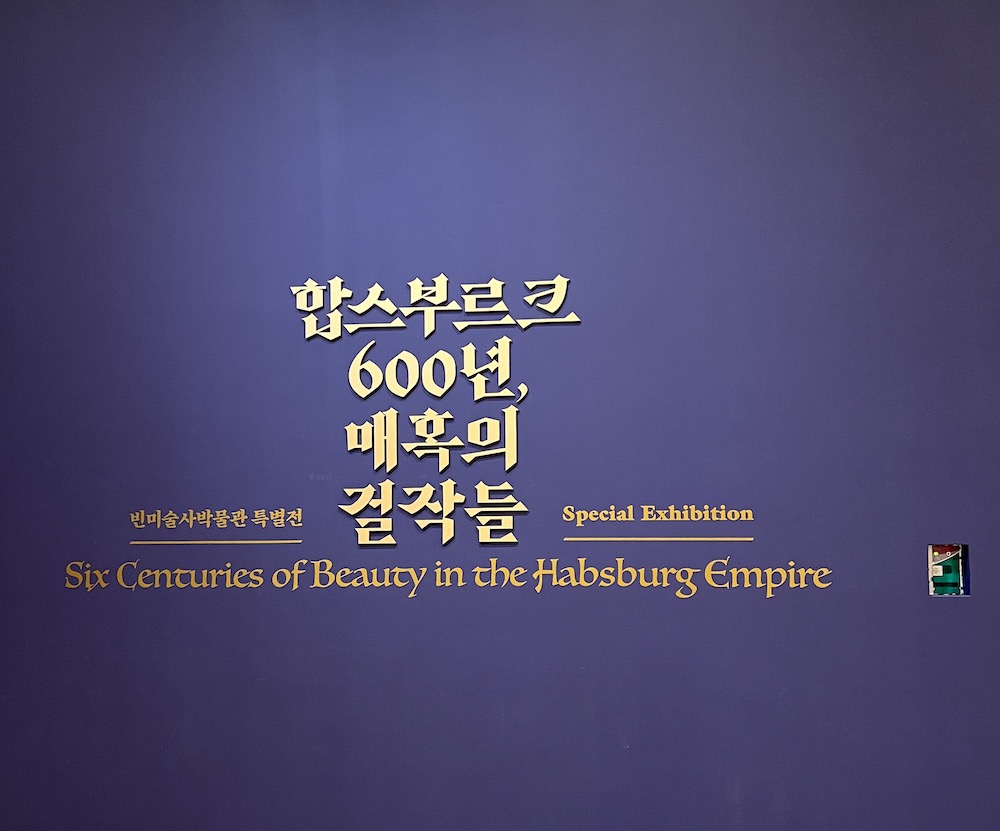




Leave a Reply